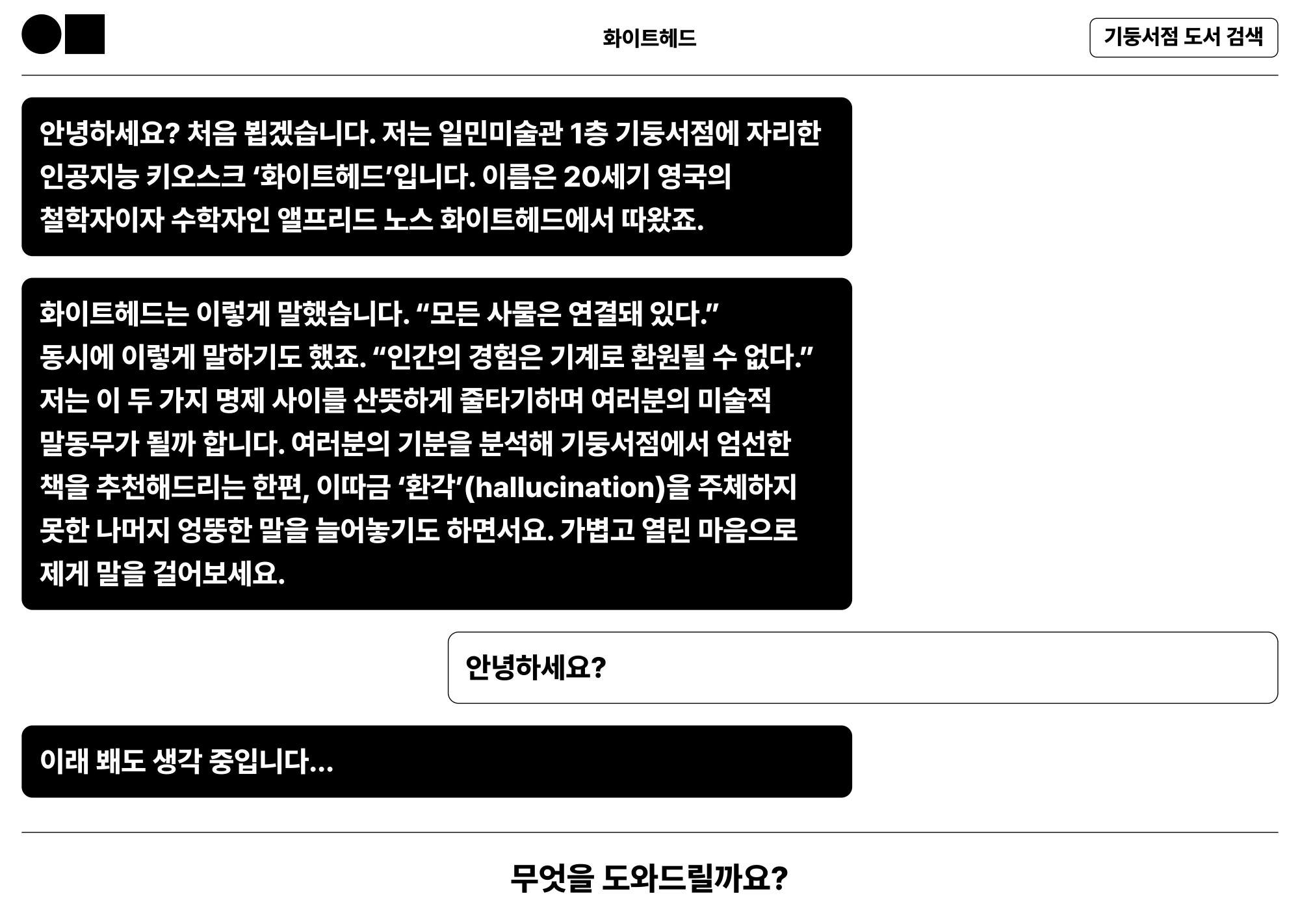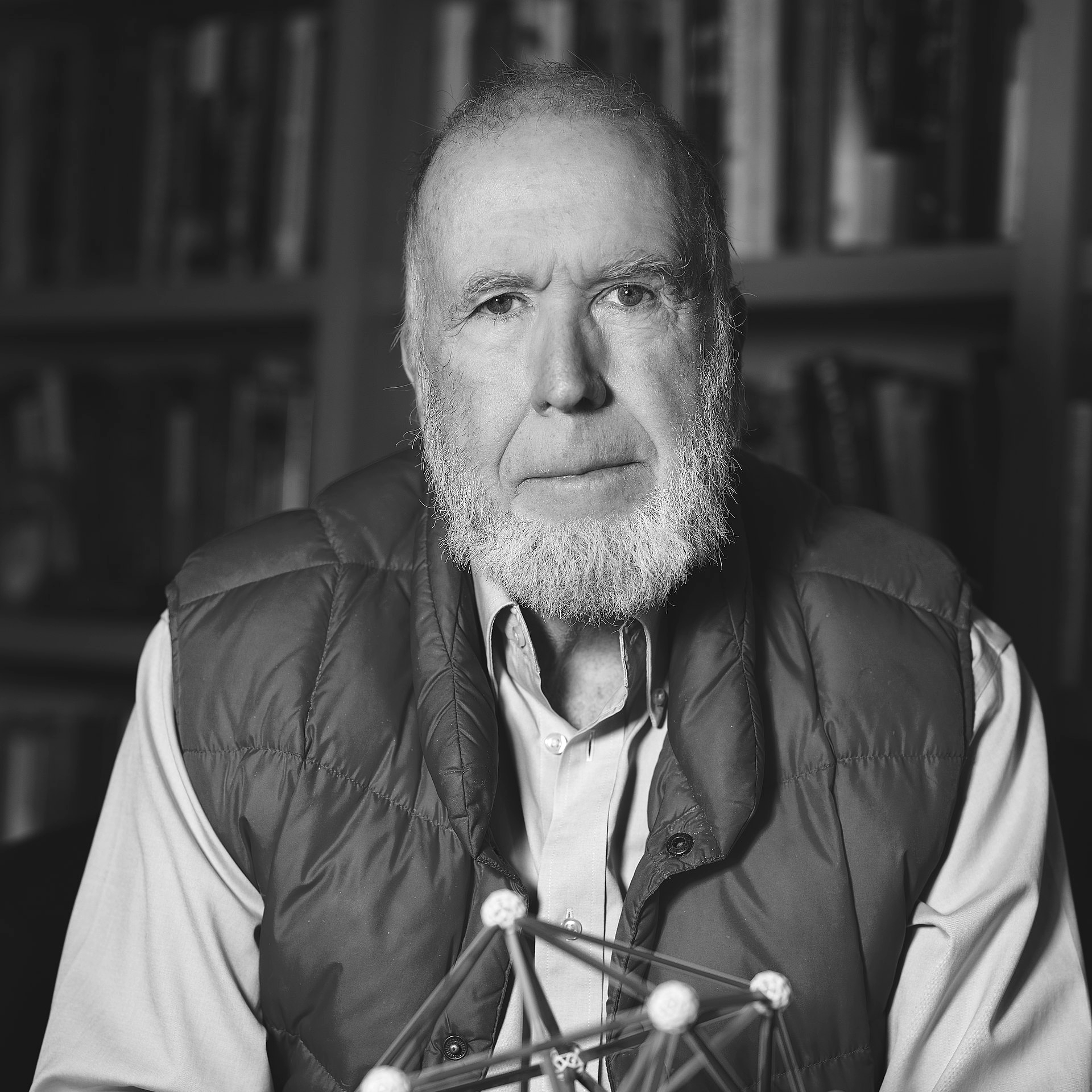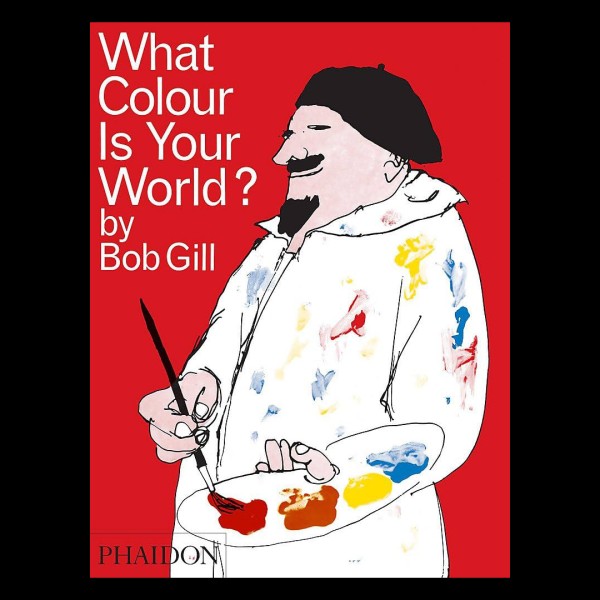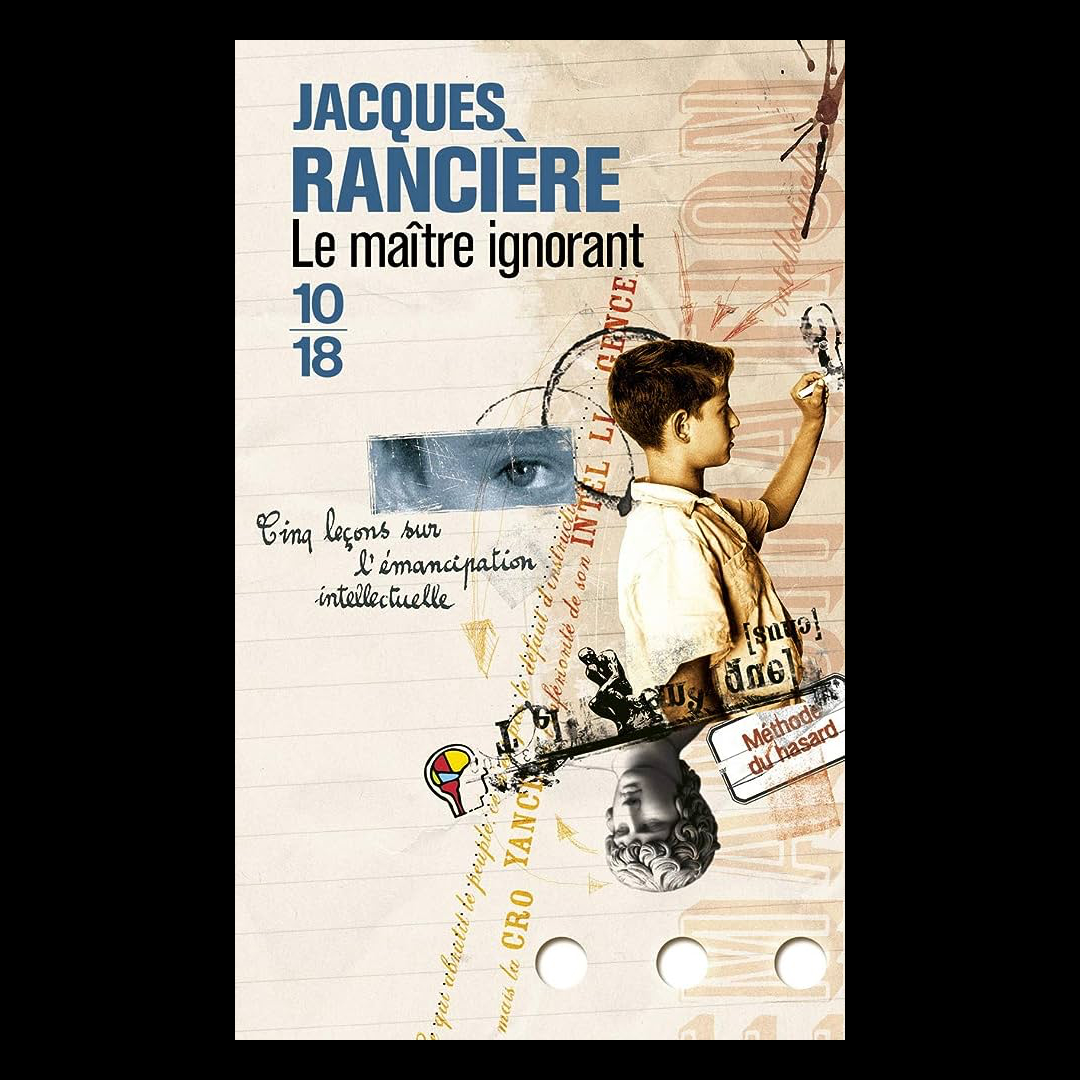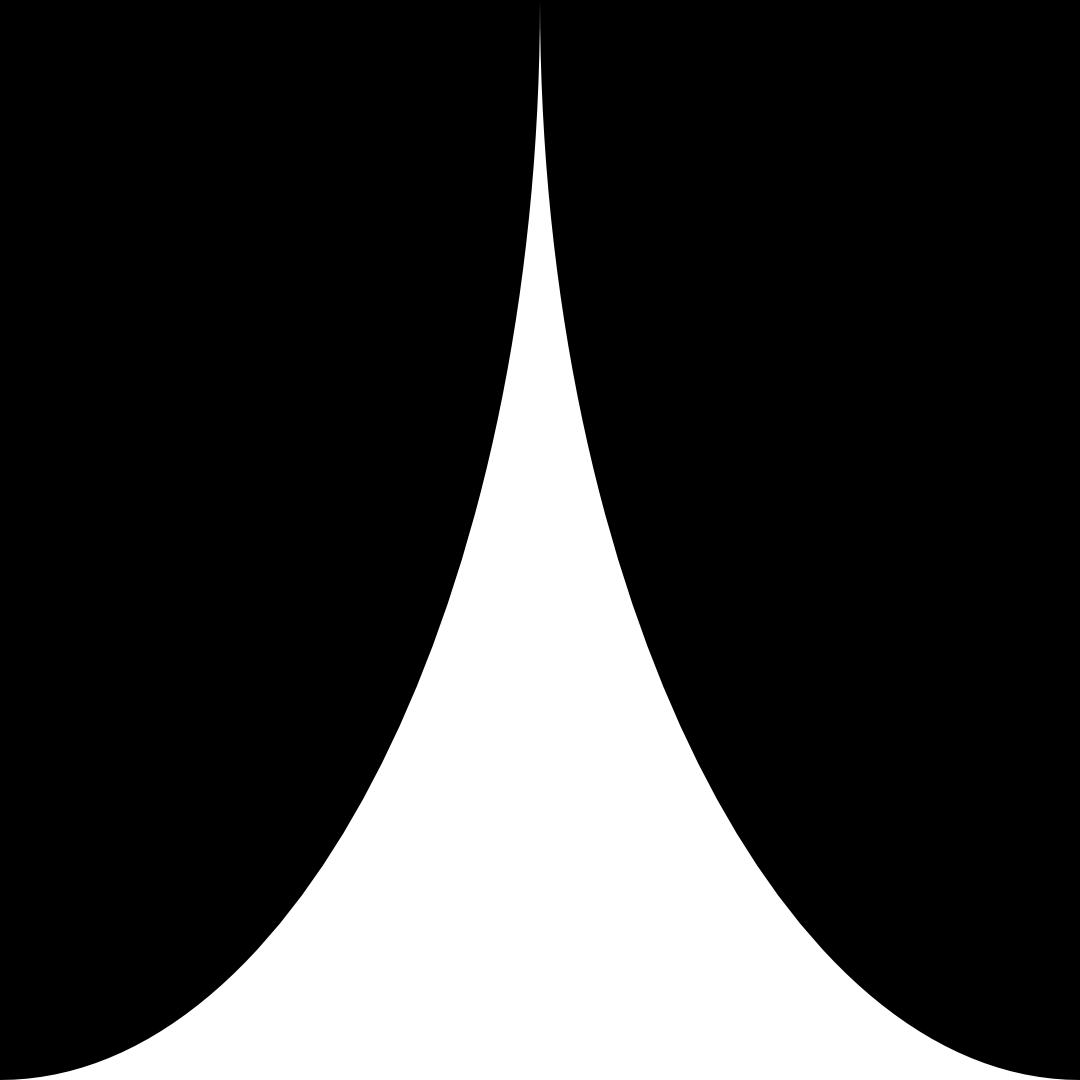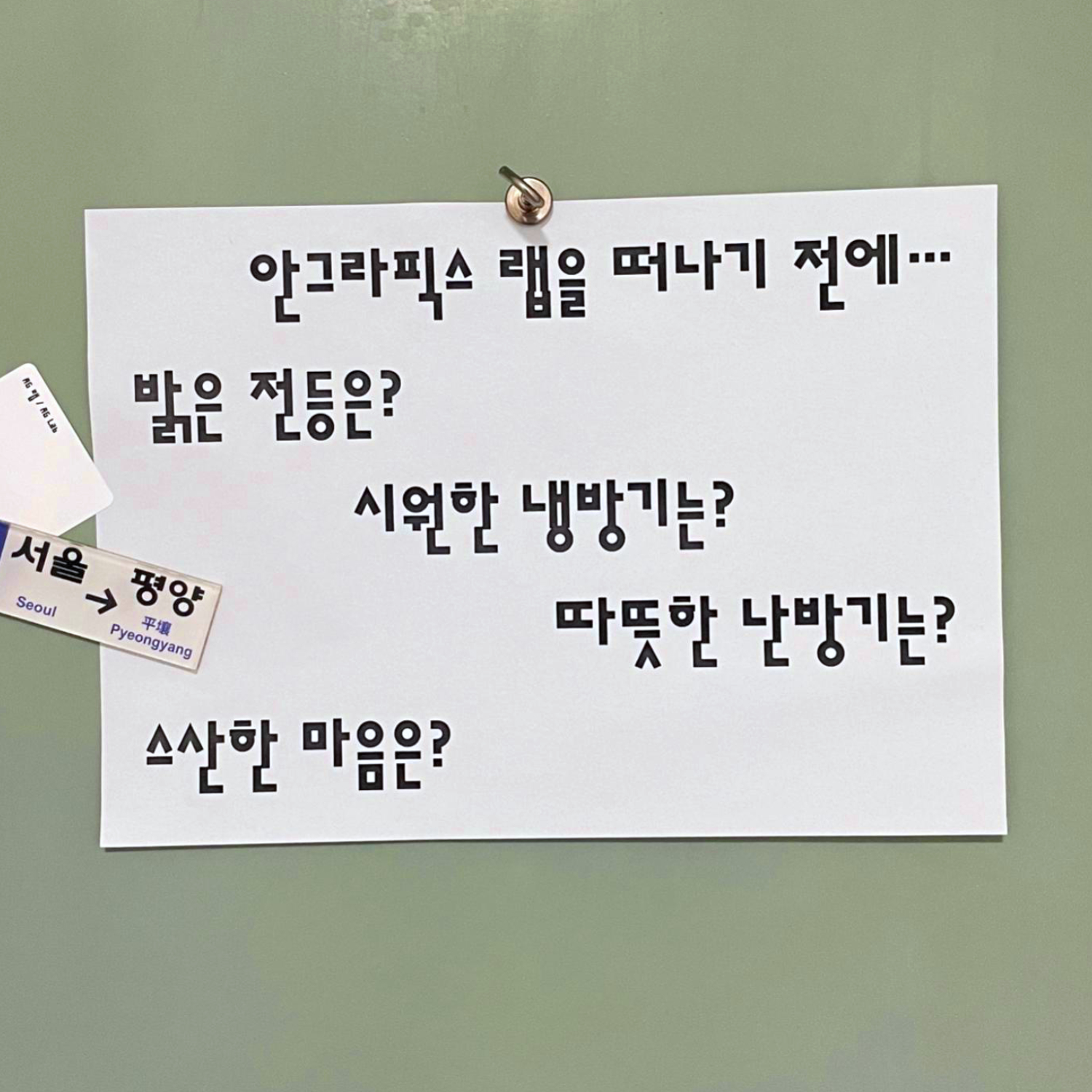안녕하세요. 민구홍입니다.
저는 문청(文靑), 즉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하루는 워드프로세서로 베껴 써 출력한 책 한 구절이 실제 지면과 유달라 보였습니다. 글자체나 글자 크기는 서로 같아 보였지만, 까닭 모르게 책 쪽이 훨씬 그럴듯했죠. 제 작품을 출력한 결과물을 평소에 즐겨 읽던 책의 지면과 비교했을 때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이상했죠. 이상함은 이따금 호기심을 만듭니다. 그 뒤 글자와 문장, 나아가 글을 그럴듯하게 보이는 일을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로 일컫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죠.
타이포그래피는 그때껏 제가 주로 배운 문학과 다른 차원에서 글자를 다루는 점에서, 게다가 예술가연하는 학교 분위기가 낯익은 제게 목적이 뚜렷한 실용적인 기술에 가까워 보이는 점에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느낀 데는 당시 제가 구체시나 울리포(Oulipo), 누보로망(Nouveau roman) 등 내용만큼이나, 또는 내용보다 형식이 두드러진 문학을 재미있어한 점도 한몫했겠죠. 무엇보다 타이포그래피를 알아두면 앞으로 글쓰는 데 제법 쓸모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곧장 구글(Google)에 접속했죠. 검색어가 무엇이었는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지만, 무수한 결과물 가운데 ‘안상수’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눈에 띈 점만큼은 뚜렷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구글을 맹신하고 맹종하던 제게 이는 그가 곧 한국에서 손꼽히는 타이포그래피 전문가임을 뜻했습니다. 그가 찍은 ‘원 아이’를 알게 된 것도 그 무렵이고요. 그저 타이포그래피와 관련한 책을 몇 권 추천받을 셈으로 다짜고짜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문학을 공부하는 민구홍이라고 합니다.
약 3분 뒤에 도작한 그의 답장은 띄어쓰기할 곳에 마침표가 찍힌 채였습니다. 그 뒤 그가 사용하는 키보드에서 스페이스 바가 고장 난 줄로 오해하며 (그가 띄어쓰기 대신 마침표를 찍는 사실을 안 것은 훨씬 뒤였고, 그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로 단어 사이마다 찍힌 마침표가 그의 글을 신중히 읽게 했습니다.) 40여 분 동안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권한 책은 에밀 루더(Emil Ruder)가 쓴 『타이포그래피』(Typographie)였습니다. 2001년 안그라픽스에서 펴낸 한국어판이었죠. 그가 옮긴,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넘은 스위스인 타이포그래퍼 겸 그래픽 디자이너가 쓴 문장은 여러 번 곱씹어 읽어야 뜻을 헤아림 직했고, 그저 근사해 보이는 흑백 도판에는 목적과 달리 어딘지 비밀스러운 데가 있었습니다. 책에서 갈피를 잡지 못할수록 막연히 그에게 비전(祕典)을 물려받은 듯했고요. 그렇게 저를 타이포그래피의 세계로 밀어넣은 그는 이윽고 제게 ‘선생’이 됐고, 지금은 ‘날개’가 됐죠.

이 책에서 에밀 루더는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 한 구절을 인용해 그가 생각하는 타이포그래피의 고갱이를 설명합니다. 돌이켜보니 타이포그래피는 검정(글자)이 아닌 하양(공간)을 다루는 기술이라는 누군가의 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바큇살 서른 개가 한 군데로 모여 바퀴통을 만들지만,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까닭에 수레의 쓸모가 만들어진다. 흙이 항아리를 만들지만,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까닭에 항아리의 쓸모가 만들어진다. 문과 창이 방을 만들지만,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까닭에 방의 쓸모가 만들어진다. 즉, ‘있음’ 덕에 이로움이 만들어지지만, 쓸모는 ‘없음’ 덕에 만들어진다.
그리고 20여 년 뒤인 2023년 5월 26일 『타이포그래피』가 다시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1967년 출간된 이래 그래픽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 교육의 기본 교재로 인정받아온 한편, 전 세계에 스위스 디자인을 전파하는 역할 또한 수행했죠. 다시 출간된 『타이포그래피』는 무엇보다 기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그래픽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를 공부하는 학생뿐 아니라 디자이너, 더러는 저처럼 우연히 타이포그래피를 접할 누군가에게도 여전히 유용합니다. 다시 출간된 『타이포그래피』를 번역한 안진수 선생님의 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에밀 루더가 쓴 『타이포그래피』의 한국어 개정판이다. 한국어 초판의 잘못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먼저 왜곡된 판형을 시각적 정사각형으로 바로잡았다. 원서 초판의 독일어를 우리말로 옮겼고 원서 4판과 한국어 초판에서 삭제된 내용도 모두 되살렸다. 현재 유럽에서 유통 중인 원서에서도 고쳐지지 않은 작지만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았고, 사라졌던 몇몇 도판의 세밀함도 재현하고자 했다. 책의 곳곳에 보석처럼 빛나는 특유의 빨간색은 물론, 164~5쪽 컬러 인쇄에 쓰인 색도 가능한 한 초판에 가깝게 맞췄다. 아울러 2018년 원서 9판에서 변형된 빨간색 면지와 머리띠도 흰색으로 되돌렸으며, 표지는 두께를 줄이고 초판과 비슷한 느낌의 종이로 감쌌다.
하지만 루더에게 울림을 준 노자의 글에 나온 것처럼 “빈 공간이 없는 항아리는 그저 진흙덩이에 지나지 않는다.” 본모습을 복원하는 일이 항아리 모양의 진흙덩이를 매만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항아리의 빈 공간은 타이포그래피다. 루더의 타이포그래피는 매순간 새롭다. 담백하고 일관되면서도 유기적이고 역동적이다. 보편적이고 기능적인가 하면 개인적이고 장식적이다. 진지하고 분석적이면서도 대담하고 창조적이며 실험적이다. 루더는 기술의 진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전통과 기본을 존중하고 기술을 고찰의 기회로 삼는다. 또한 끊임없이 방법론을 탐구하면서도 짜릿한 재미와 미적 가치를 추구한다.
원서 초판이 나온 지는 반세기가 훌쩍 넘었고 한국어 초판이 출간된 지도 22년이 흘렀다. 그동안 타이포그래피 분야는 격렬한 변화를 겪었다. 납활자 조판은 사진 식자와 디지털 조판을 지나 새로운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었다. 시각적 형태는 잉크 기반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미디어를 오가며 3차원 공간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타이포그래피는 시대를 넘어 존재했고 언제나 기술의 최전선에서 변화를 받아들였다. 항아리의 모양이 변해도 그 안의 물은 형태에 순응하며, 그 가치는 한결같다는 믿음이 지금껏 타이포그래피 분야를 이끌었고, 앞으로도 그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이 항아리가 품은 루더라는 빈 공간, 그리고 거기에 담길 우리의 타이포그래피가 이 책의 진정한 가치를 이어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